글로벌 경영 환경의 핵심 화두였던 ESG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념 논쟁이 ‘ESG 피로감’을 낳았고, 다수 기업이 ESG를 규제 대응을 위한 ‘비용’이자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나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공시, 공급망 관리 등에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노출하며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규제가 약화되면 ESG 이행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마저 감지된다.
이는 ESG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 ESG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 접근법이다. 기업들은 이제 ESG 평가와 정보공시 규제 대응을 위한 수많은 KPI를 관리하는 수동적 접근 방식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김정남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사진=법무법인 화우]](https://image.inews24.com/v1/5f83bf53fcd67b.jpg)
기업의 고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재무적 성과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다시금 진화해야 할 때다.
규제를 넘어, ‘성장 기회’를 창출하라
지금까지 많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은 ‘내부 공정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머물러 왔다. 진정으로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한 기업은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자. MS는 2030년 ‘탄소 네거티브’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10월 카본 리무버(Carbon Removal) 스타트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풍화 암석 강화(Enhanced Rock Weathering)’라는 혁신 기술로 대기 중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MS가 단순히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초기 구매자가 돼 ‘탄소 제거’라는 새로운 시장 자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사의 넷제로 목표 달성(리스크 관리)과 동시에, 미래 핵심 산업(탄소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비즈니스 전략이다.
지속가능성 전략은 비단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이 자신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사의 사업적 ‘어려움(Pain Point)’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사회 문제에 분산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사의 역량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영리한 전략이다.
르완다의 의료 물품 배송 기업 ‘집라인(Zipline)’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혈액이나 백신 공급이 어려웠던 르완다의 문제를, 집라인은 자사의 핵심 역량인 ‘드론 기술’로 해결했다. 이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었다.
반복적 혁신과 정책 조정을 통해 드론 비행 허가와 국가 서비스 계약 등을 이뤄냈고, 그 결과 기존 오토바이 배송보다 85%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사회 문제 해결이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책은 ‘신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전환 흐름은 국내에서도 산업 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현 정부의 5개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27개가 ESG 관련 과제이며 특히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분야에 향후 5년간 7조원의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은 분명 중요한 ‘신호’이지만, 정책 자체가 기업의 수익모델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기업 스스로가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비용 절감’과 ‘시장 창출’의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
이는 순환경제나 저탄소 전환을 단순한 ESG 체크리스트나 보여주기가 아닌, 기업의 수익 창출과 리스크 관리의 핵심 도구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실용’과 ‘성장’을 위한 모두의 역할
지속가능성은 이해관계자들의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방어적 활동이 아니다. 이는 기업이 고유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과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적극적 ‘성장 전략’이다.
정부 역시 단순 규제뿐 아니라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독려해야 한다. 투자자 또한 기업 공시를 활용해 단편적인 ESG 리스크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 관련 ‘성장 기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정남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jnkim@yoon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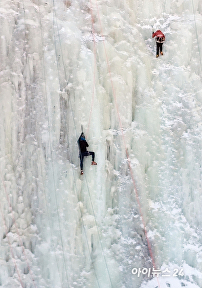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