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시행 10년이 넘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며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중소 납품업자 등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됐는데,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 등 판매채널 다변화로 유통업체의 지위가 약해지고 납품업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7bb3065393a7d.jpg)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가 국내 유통시장을 과점하면서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격화되자 2012년 특별법으로 시행됐다.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보유한 소매업자가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상품 반품 또는 판매 촉진 비용 전가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 등 판매채널 다변화로 대형 유통사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고, 이에 비해 대형 제조사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를 갑, 납품업자를 을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대기업이지만 대규모유통업법상 을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적잖다. 법규상 판촉비용 부담 주체 중 납품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체 판촉비용의 50%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규모의 납품업자는 다양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 매출 증대 및 기업 영향력 확대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비용 분담 의무 규정으로 인해 판촉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영상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판단 기준을 다른 하도급법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2조3항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우월적 지위 판단이 용이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기업 납품업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두면서 중소 납품업자와 대형 유통사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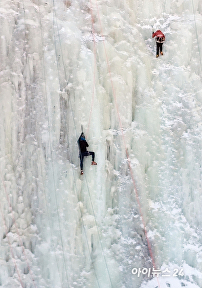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