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에서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산불 위험 시기도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경북 산불은 축구장 6만3245개 면적을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
그린피스는 산업화 이전 대기 상태의 지구와 현재 지구 사이의 산불 위험지수(Fire Weather Index, FWI) 차이를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연구 의뢰했다. 그 결과 산불이 위험한 날이 연간 최대 120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산업화 이전과 현재 기후 사이에 발생한 산불 위험 일수의 변화. 갈수록 산불 위험일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그린피스]](https://image.inews24.com/v1/b0276b3119ed98.jpg)
전국의 산불 위험지수는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유무에 따라 산불의 위험한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김 교수팀은 기후 모델 기반의 가상지구(MetaEarth)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화 이전 지구와 현재 지구에서의 산불 위험지수를 계산, 비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이용된 모델 중 대표적 다섯 가지를 사용해 산불 위험지수를 도출했다. 그 결과의 평균값을 이용했다.
산불 위험지수(FWI)는 기온(온도), 습도, 바람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산출한다. 지수가 20이상이면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본다.
산업화 이전과 현재 지구 두 모델의 산불 위험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간 활동에 의한 온난화가 존재하는 현재는 20이상의 높은 산불 위험지수가 지속되는 기간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기준 최대 120일 길어졌다.
![산업화 이전과 현재 기후 사이에 발생한 산불 위험 일수의 변화. 갈수록 산불 위험일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그린피스]](https://image.inews24.com/v1/7de8c9ccdfb84d.jpg)
최대 일수를 기록한 곳은 경북 지역이었다. 남한 전 지역 모두 산불이 위험한 시기가 전보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산불 위험지수가 20이 넘는 날이 기존 2월 마지막주에서 첫째 주로, 전남은 4월 둘째 주(15일)에서 3월 첫째 주(4일)로 앞당겨졌다. 충북, 대전, 대구 역시 4월에서 3월로 위험 시기가 빨라졌다.
산불 위험지수의 강도 또한 남한 전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 산불 위험기간인 3·4·10·11월 산불 위험지수가 전국적으로 평균 10%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충청, 전라, 경북 등 중남부 지역에서 이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기존 산불 위험지수가 높았던 지역은 그 위험이 더 커졌다. 소백산맥 인근은 현재 지구에서 산불 위험지수가 20을 초과하는 날짜가 최대 151일로, 산업화 이전 최소 14일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김 교수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전반적으로 산불 위험 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작일은 앞당기고 종료일은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혜영 그린피스 기상기후 선임연구원은 “산불은 폭염, 폭우, 태풍 등 다른 기후재난과 달리 인간 실화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기후변화와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대형화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한반도의 기후가 대규모 산불에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달 발생한 의성·안동 산불에서 알 수 있듯 기후위기는 대형 산불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적이고 파편적 대응만으로는 대형화하고 반복되는 ‘기후재난형 산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산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인 기후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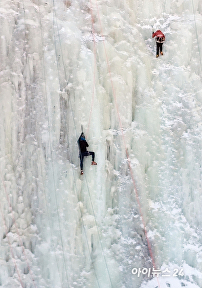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